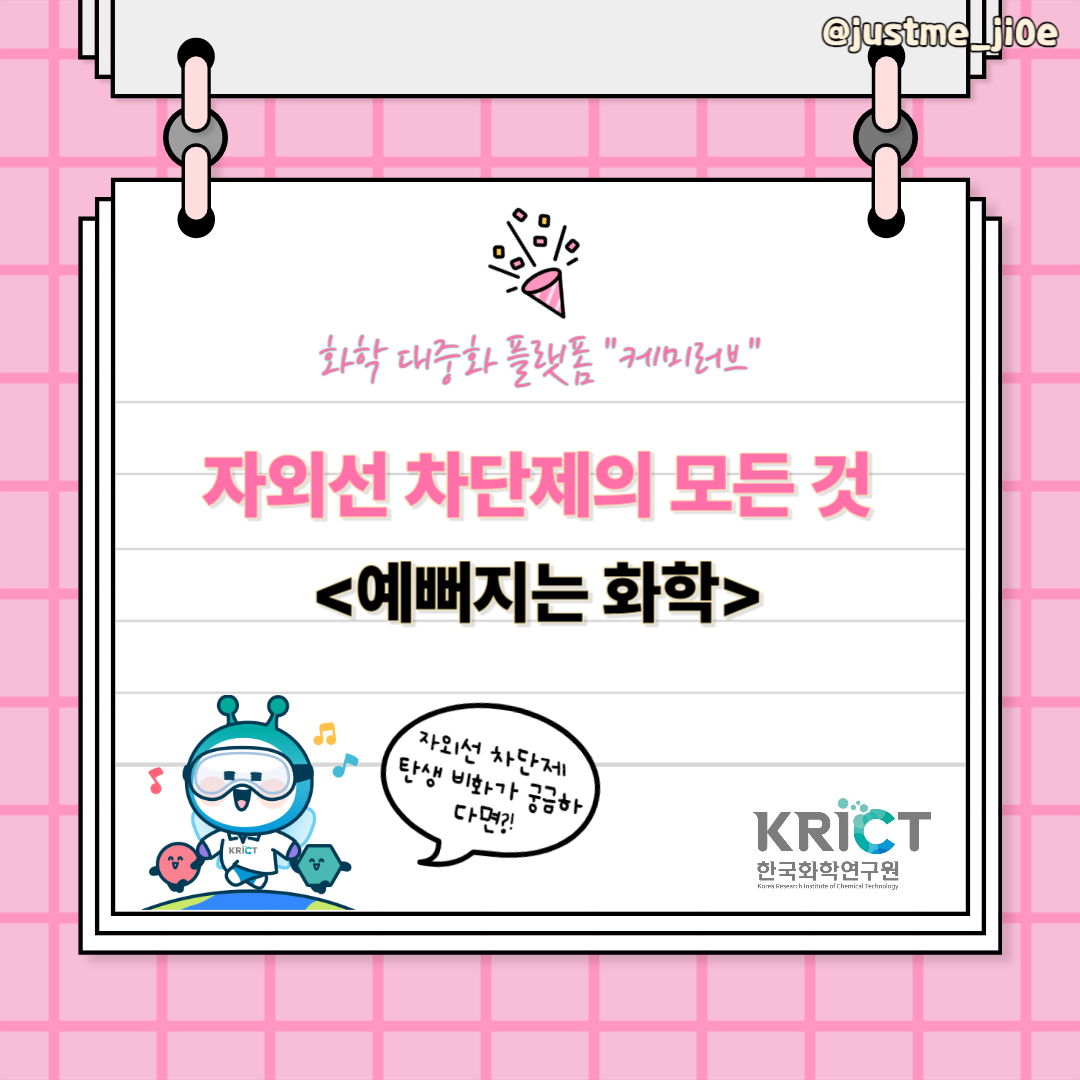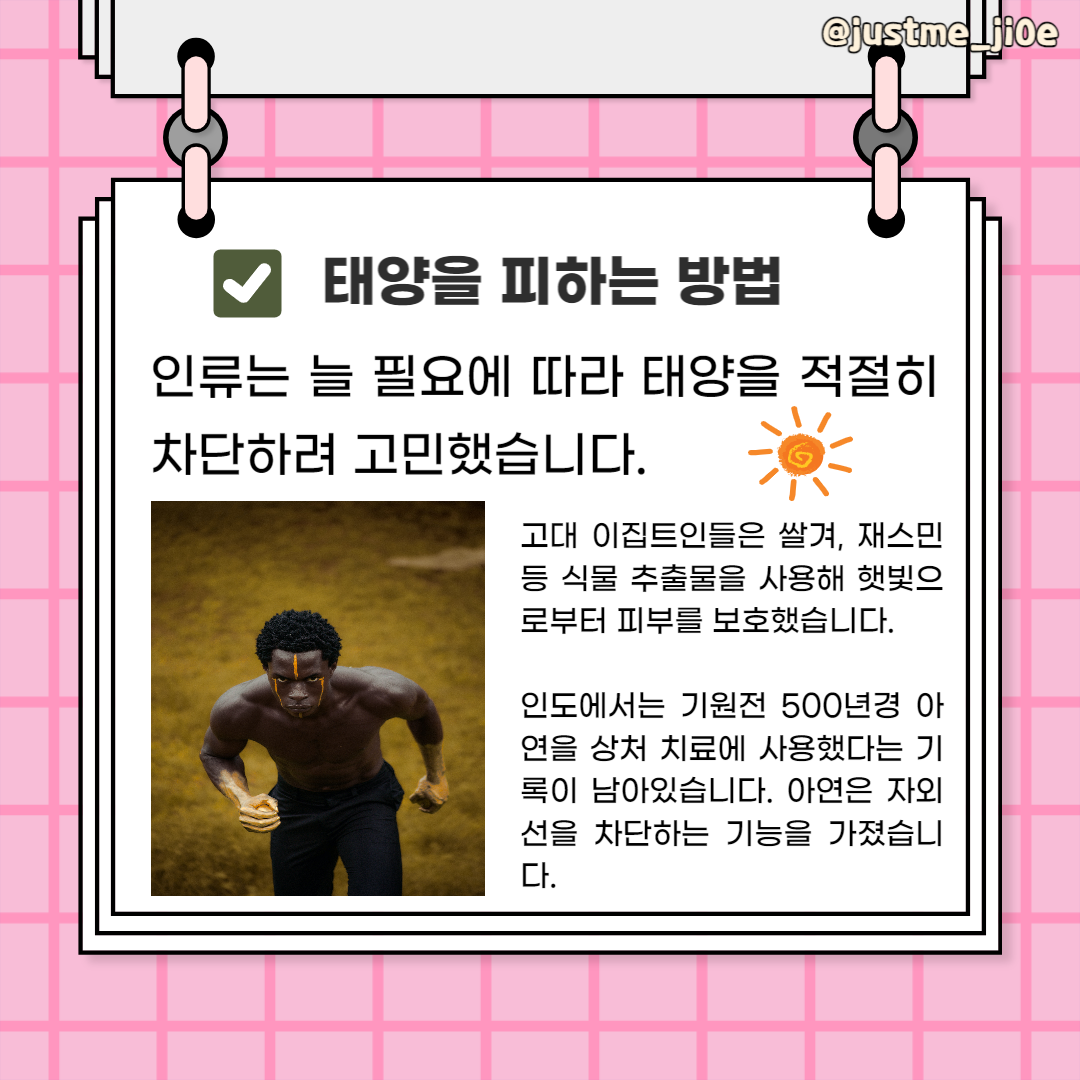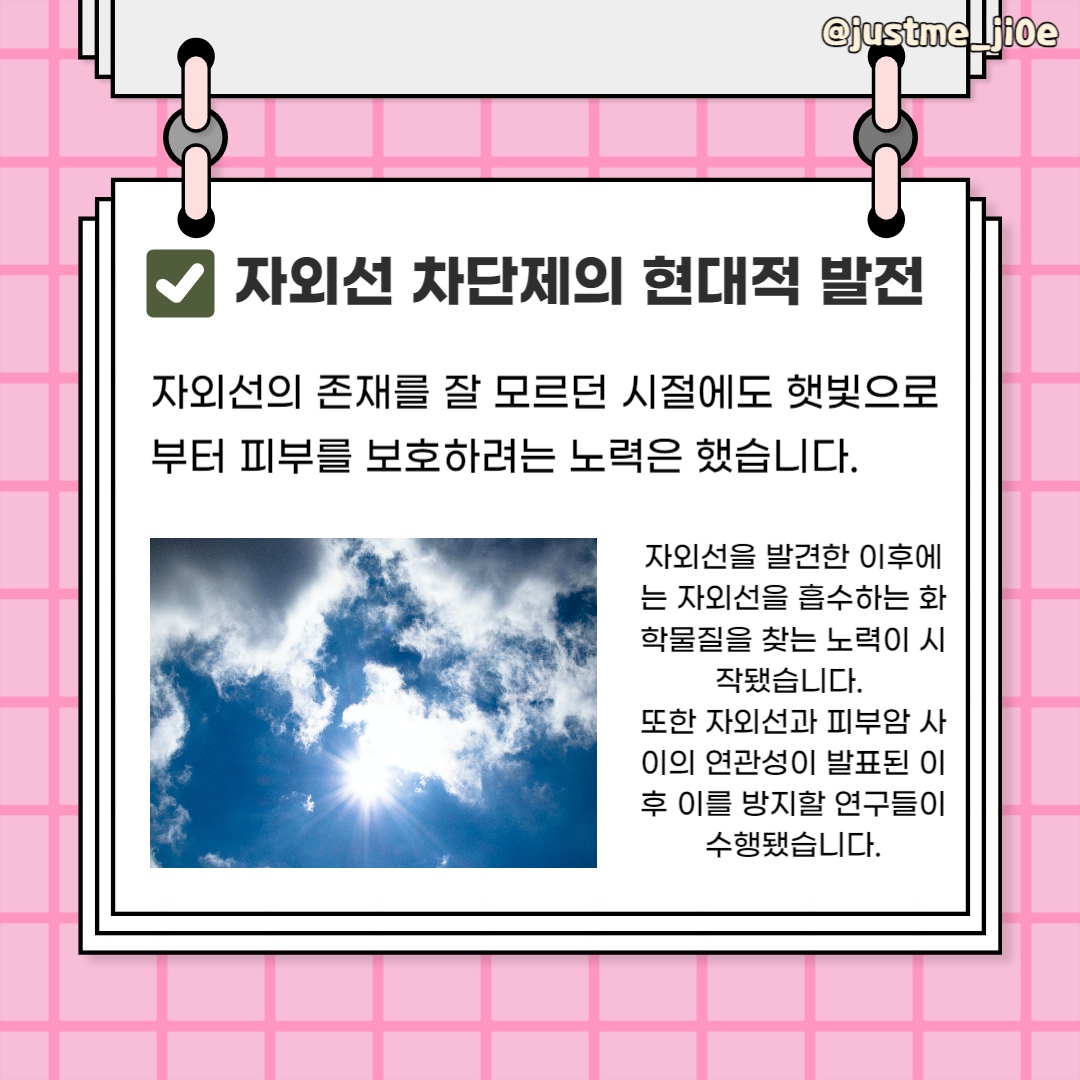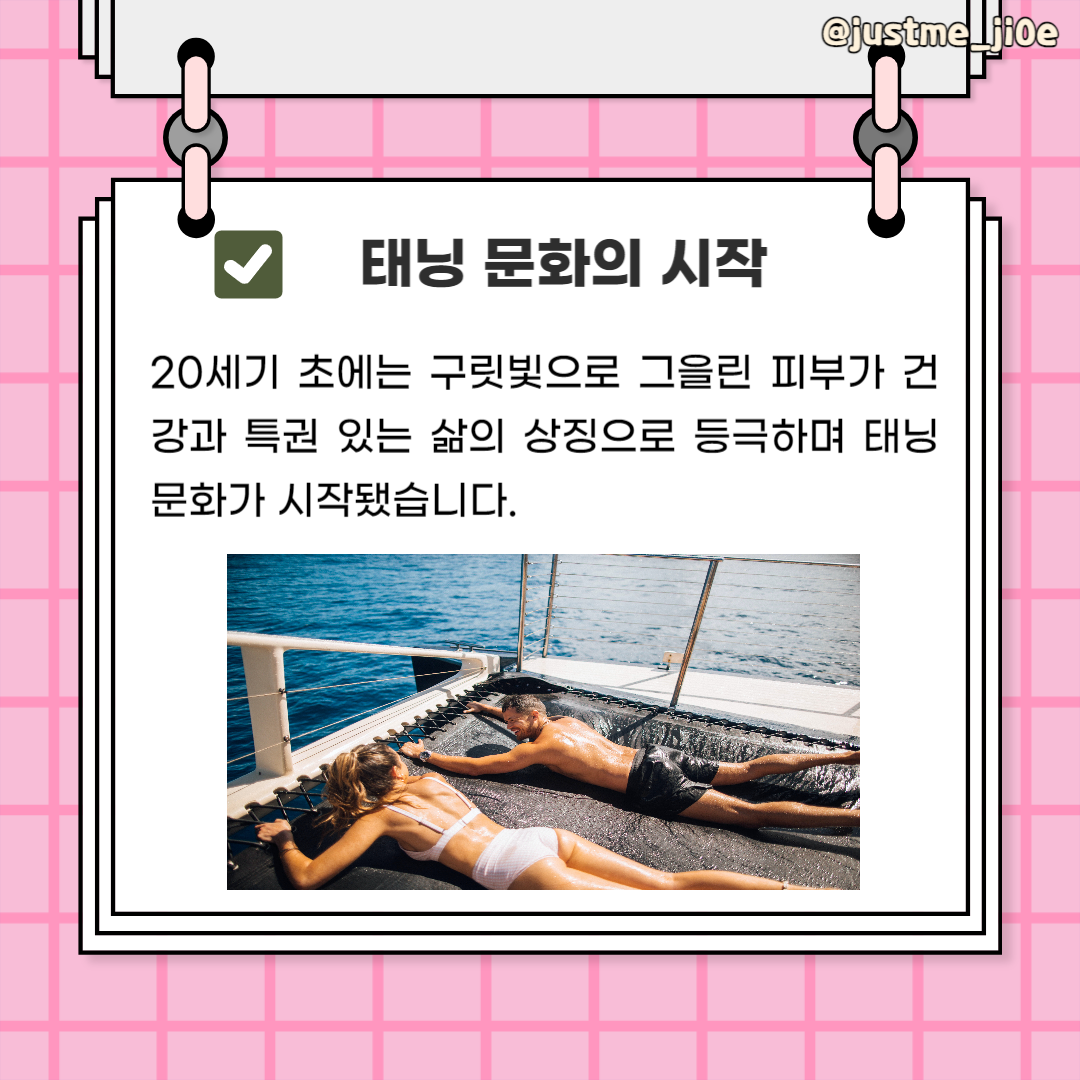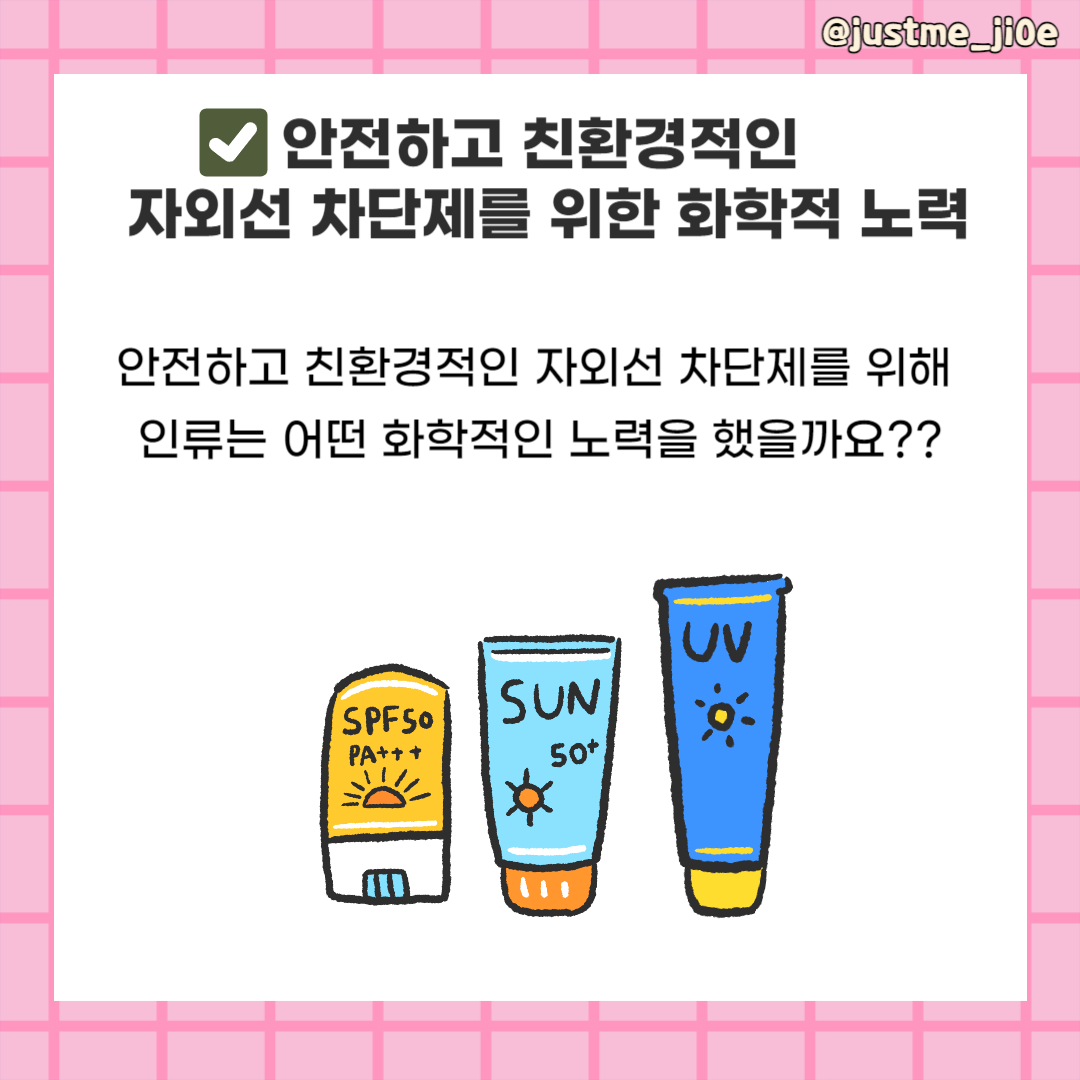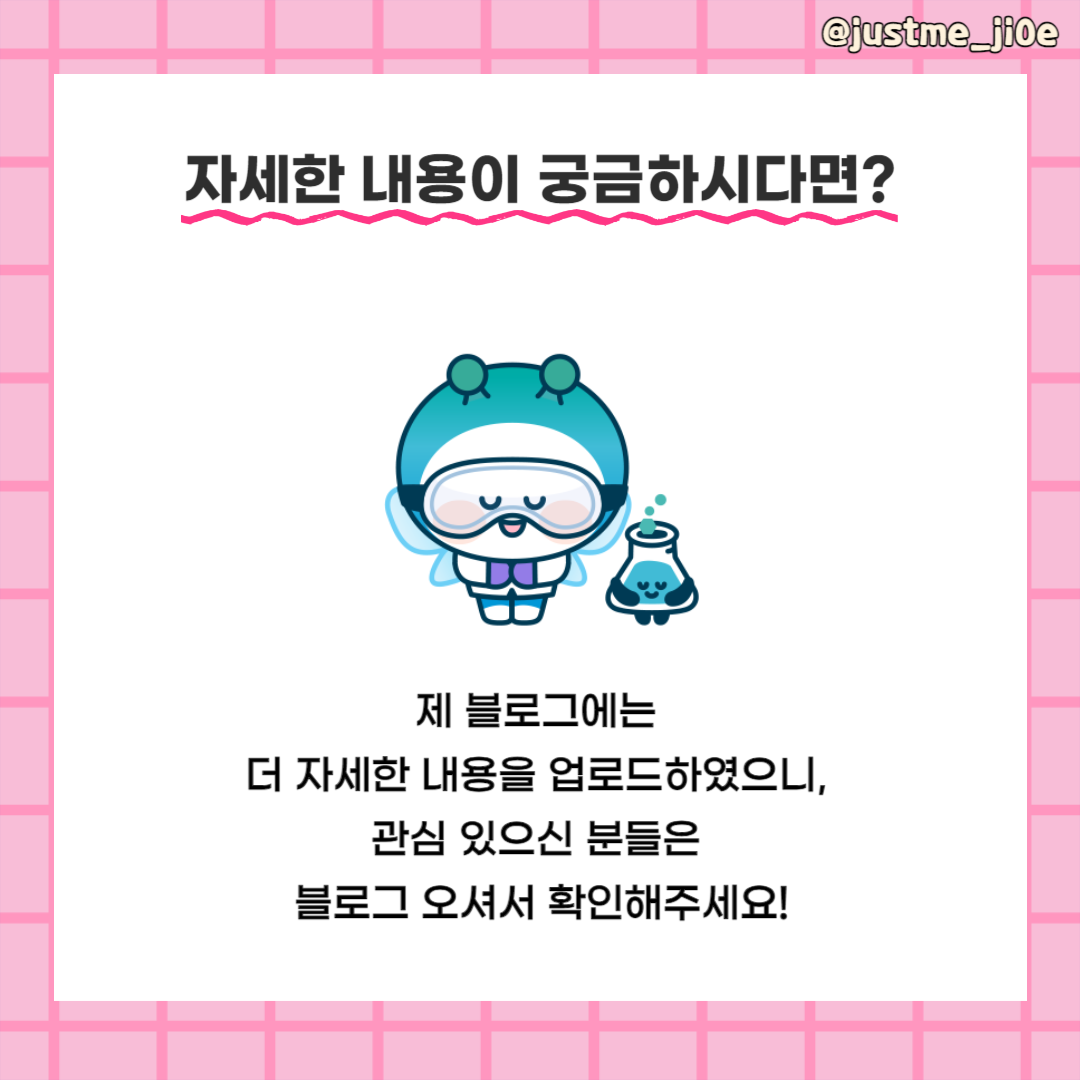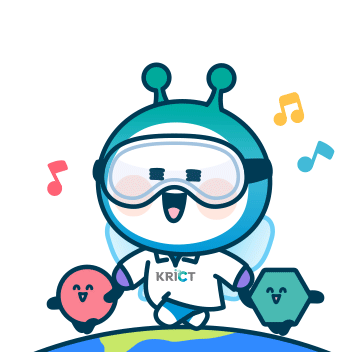[10월 김지영] 자외선 차단제의 모든 것 1
안녕하세요 케미러브 서포터즈 4기입니다!
오늘부터 자외선 차단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적 선크림의 탄생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는 방법
오늘은 "현대적 선크림의 탄생" 비화를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적 선크림의 탄생
예뻐지는 화학
태양을 피하는 방법
예뻐지는 화학
현재 우리가 쓰는 자외선 차단제의 역사는 100년 안팎이지만 태양은 인류가 탄생하기 전부터 존재했고, 인류는 늘 필요에 따라 태양을 적절히 차단하려 고민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햇빛으로 피부를 보호하고자 쌀겨, 재스민, 루핀 등의 식물 추출물을 사용했는데, 쌀겨 성분은 요즘도 선크림에 쓰이곤 합니다.
아프리카 나미비아 지역의 힘바족 여성은 버터, 붉은 황토를 섞은 오지제(Otjize)라는 붉은 반죽을 머리카락과 피부에 발랐습니다. 현대의 힘바족 사람들은 이런 전통이 아름다움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과거에 이 전통의 시작이 태양이나 곤충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인도에서는 기원전 500년경 아연을 상처 치료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아연은 피부에 흡수되지 않지만,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리모니아'라는 과일나무 껍질로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어 발랐습니다. 따나까(Thanaka)라 불리는 이 분말액은 지금도 미얀마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납작한 돌판에 리모니아 나무를 갈면 노란색 또는 연두색 분말액이 나옵니다. 이를 햇빛에 노출디는 얼굴과 팔, 다리에 바르는데, 얼굴에는 주로 볼과 이마에 바릅니다. 따나까는 자외선 차단은 물론 피부 트러블을 치료하고 모공 수축에 탁월한 천연화장품 역할을 했습니다.
북극 근처의 극지방 사람들은 약간 다른 이유로 태양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얼음과 눈에 반사된 태양광은 실명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알래스카, 시베리아, 그린란드에 정착한 초기 이주민들은 가죽, 뼈, 상아, 나무를 엮어 알 작은 안경 같은 고글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고글은 시야를 좁혔지만, 자외선의 유입량을 줄여 안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스칸디나비아의 바이킹들은 눈부심을 줄이기 위해 아이라이너를 사용했습니다. 남녀 모두 전투에 참여했는데,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 안티몬, 탄 아몬드, 납, 산화구리, 재를 섞어 눈 밑에 발랐습니다. 요즘 야구 선수들도 눈 밑에 검정 테이프를 붙입니다. 눈 밑에서 직사광선이 반사돼 눈부심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현대적 발전
예뻐지는 화학
자외선의 존재를 잘 모르던 시절에도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으로, 즉 주로 산란현상을 이용해 자외선을 차단하는 산화아연은 기원전 500년경 고대 인도에서 사용했습니다. 벌어져 있는 상처는 물론이고 눈에 연고 형태로 발랐습니다. 14세기 미얀마 사람들이 나무 껍질을 갈아서 만든 자외선 차단제 '따나카'에도 산화아연 입자를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무기 자외선 차단제 성분은 산화아연 외에 이산화티타늄도 있었습니다.
1801년 독일의 의사 겸 화학자인 요한 빌헬름 리터가 자외선을 발견한 이후에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화학물질을 찾는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1899년 스웨댄 의사 요한 위드마크는 퀴닌황산염(quinine sulfate)이 자외선 B를 흡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해머는 위드마크의 실험 결과를 활용해 1891년 로션이나 연고에 퀴닌이 포함되면 태양빛을 차단하고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현대 선크림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911년 독일 피부과 전문의이자 피부병리학의 선구자 중 한 명인 파울 거슨 운나는 마로니에추출물 에스쿨린(aesculin)을 이용해 자외선 차단제를 개발했습니다. 운나는 1896년 피부암과 햇빛 사이의 연관성을 처음으로 발표했고, 이를 방지할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태닝 문화의 시작
예뻐지는 화학
아름답게 피부를 태우는 선탠 혹은 태닝 문화는 20세기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명품 브랜드로 유명한 코코 샤넬이 1920년대 지중해의 크루즈에서 찍은 사진이 널리 알려지면서, 구릿빛으로 그을린 피부가 건강과 특권 있는 삶의 상징으로 등극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암의 위험에 자유로우면서도 건강해 보이는 피부를 갖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와 태닝 오일이 개발됐습니다. 1928년 자외선 B를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벤질살리실레이트와 벤질신나메이트를 함유한 자외선 차단제가 개발됐습니다. 또 프랑스의 유명한 화장품 회사 로레알의 설립자 외젠 슈엘러는 벤질살리실레이트와 파라아미노벤조산을 함유한 태닝 오일 '앙브레 솔레르(Ambre Solaire)'를 내놓았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선스크린 혹은 선크림이 되는데, 이 제품이 로레알의 지금 명성에 이바지했습니다. 프랑스의 노동자들이 휴가 기간에 해변에 놀러 가며 이 제품을 구매한 덕에 큰 성공을 거두어는데, 이 성공을 바탕으로 1939년 회사 이름은 현재의 로레알로 바뀌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은 선크림을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전에는 약사였던 미 해군의 조종사 벤자민 그린은 높은 하늘에서 비행 임무를 수행하던 중 따가운 햇볕 때문에 화상을 자주 입었습니다. 그래서 '베테랑의 빨간약(Red Veterinary petrlatum)'을 개발했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끈적끈적한 젤리 형태의 자외선 차단제였는데, 사용하기 불편해도 효과는 좋아 조종사들 사이에서 인기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 코코넛 오일, 코코아 버터 등을 섞어 촉감을 개선했고, '코퍼톤(Coppertone)'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해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자외선 차단제를 위한 화학적 노력
1940년대부터 자외선을 막으려고 사용된 화학물지로는 파라아미노벤조산(PABA)이 있습니다. PABA는 자외선 B를 흡수할 수 있어 여러 자외선 차단제의 핵심 성분이었습니다. 하지만 PABA가 포함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사람 중 일부는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붉고 가려운 발진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누적되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점차 PABA를 사용한 자외선 차단제가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미국 FDA는 2019년 PABA를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했을 때 안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PABA는 자외선 차단제에는 물론 샴푸, 컨디셔너, 립스틱 등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각국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효과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함유 성분과 농도를 규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1951년부터 자국 내 선크림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성분과 농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앞서 피즈 뷘을 만들었던 스위스의 글라이터는 자외선차단지수 개념인 SPF 지수를 1962년 최초로 제안했습니다. 피부 표면 1cm^2당 자외선 차단제 2mg을 균일하게 발랐을 때 차단되는 자외선의 양으로 효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SPF 지수는 자외선 B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미국 FDA는 1988년 자외선 A의 차단을 설명하는 지수 PA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앞선 장에서 설명했듯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PF와 PA로 성능등급을 판별하고 있으며, 성분과 농도를 엄격하게 규제해 피부에 혹시나 있을 위해를 막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닷속 산호를 지키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 중 하나인 옥시벤존의 사용을 금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과학자들은 2016년 옥시벤존이 산호나 말미잘 같은 자포동물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옥시벤존은 사람 피부 위에 바르면 자외선을 차단하지만, 사람들이 바다에서 수영해서 녹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산호나 말미잘의 공생미생물이 녹은 옥시벤존을 흡수하는데, 흡수된 옥시벤존에 자외선이 닿으면 열에너지로 전환돼 주변 생물의 세포를 파괴합니다. 아직 이러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하와이는 산호를 지키기 위해 2019년 옥시벤존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옥시벤존을 대체하며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성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