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일론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입고 있을까(3)
또 다른 사건은 나일론 발명자 캐러더스의 자살이었다. 캐러더스는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 불렀으나, 정작 그는 종종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에 빠져들곤 하였다. 더욱이 나일론을 발명한 당시에는 알코올중독 증상까지 보였으며, 며칠씩 연구실에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어떤 때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조차 모르기도 했다. 결국 증상이 심해진 캐러더스는 1937년 4월 28일, 필라델피아 호텔에서 음독자살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겨우 마흔하나였던 캐러더스는 자기가 발명한 나일론이 본격적으로 생산되어 세상이 나일론 선풍에 휩싸이는 것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 나일론 발명으로 노벨상 수상이라는 영광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모든 영광을 뒤로 한 채 생을 마감한 불운한 천재였다.
현재 나일론은 섬유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1941년 영국에서 발명된 폴리에스테르, 1938년 독일에서 발명된 아크릴 섬유와 함께 나일론은 3대 합성섬유 중 하나로서 인류의 의생활에 혁명을 일으킨 주인공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5대 합성섬유 생산국에 속하며, 전 세계 인구의 약 5퍼센트가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섬유로 만든 옷을 입고 있다. 요즘은 일반 의류뿐 아니라 잠수복, 방수복, 우주복 등 특수용도를 위한 새로운 기능성 합성섬유의 개발도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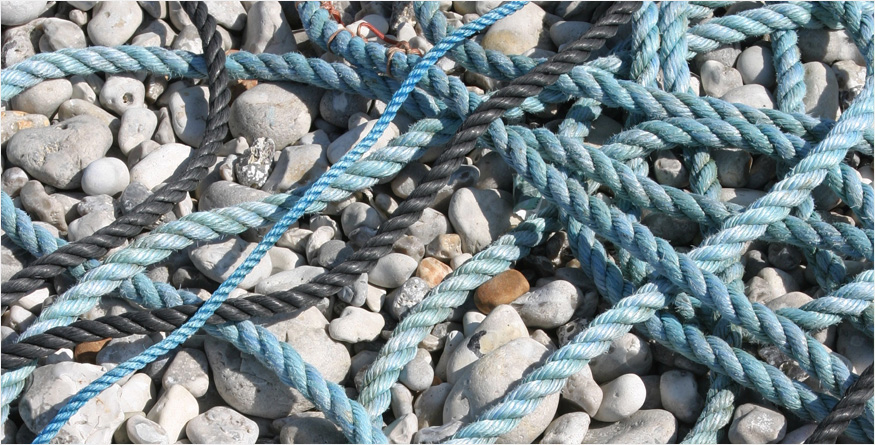
그 후 세상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하는 또 다른 섬유가 발명되었다. 1970년 후반 뒤퐁사는 방탄조끼 제조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초강력 섬유 개발을 발표했다. 흔히 케블라(Kevlar)라고 부르는 이 방향족 폴리아미드는 테니스라켓, 소총손잡이, 낚싯대 등 복합재료 보강 재료로 널리 애용되고 있으며,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에도 사용되고 있다. 케블라의 동생쯤 되는 것으로 노멕스(Nomex)라고 부르는 또 다른 방향족 폴리아미드는 케블라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 우주복, 소방복, 화부의 장갑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합성섬유의 역사는 비록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렇듯 우리의 의생활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기계적 강도를 지니는 새로운 합성섬유들은 산업재료로도 점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합성섬유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국인 과학자가 있다. 그는 전남 담양에서 태어난 이승기로 일본 교토대학을 다녔으며, 1938년에는 폴리비닐아세탈(비닐론)이라는 새로운 합성섬유를 발명하여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 공로로 그는 같은 해에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곧 교토대학 교수가 되었다. 미국과 독일이 새로운 섬유를 발명해 발표했지만, 일본은 그것에 대적할 만한 발명이 없어 매우 의기소침해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승기의 발명은 일본의 자존심을 세워준 사건이었다. 일본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고, 일본정부도 이 섬유의 대량생산을 독촉했다. 이 새로운 합성섬유에 ‘합성1호’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만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이를 기다렸는지 알 수 있다. 더구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은 군인들에게 입힐 전투복 제조에 사용할 튼튼한 섬유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승기의 비닐론은 대량생산되기 전에 일본은 패망했고, 그는 곧 귀국해 서울대학 공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이 땅에 고분자과학의 뿌리를 내리려 노력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해방 후의 사회적 ·정치적 혼란 속에서 그는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해 크게 회의했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월북했다. 그는 북한에서도 비닐론 개발 연구를 계속해 1961년부터 북한에서 비닐론 섬유 생산이 시작되었다. 북한은 이 섬유를 비날론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승기의 비닐론 발명은 캐리더스보다 3년밖에 뒤지지 않는 우리 과학자의 쾌거였으나, 그를 위대한 과학자로 키우지 못한 분단국가의 참담한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지만 합성섬유의 대부분이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합성섬유의 미래를 매우 걱정하고 있다. 인류는 석유의 고작 3퍼센트만을 화학제품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을 연료로 태워버리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고무와 함께 현대 재료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합성섬유의 우수성을 우리 인류가 오래 즐기기 위해서는 석유자원의 보호와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이 시급하다. 석유가 고갈되는 날 합성섬유도 이 지구상에서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